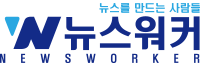검찰에서도 근로자와 하도급자 판단에 갈팡질팡
2010년 8월 ‘진위~남사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했던 K씨(53)는 같은 해 11월 18일에 근무 중 상해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후 K씨는 밀린 급여와 산재처리를 받으려고 해당 건설사와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지급 및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K씨가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자에 불과하다며 산재처리의 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K씨는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사실상의 운영주인 B씨가 도급 비를 횡령했다며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조사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이뤄졌다.
반면, 법원은 K시의 고소에 대해 피고소인인 건설업자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유는 여주지청이 K씨를 하도급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 건설업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K씨는 소송에서는 졌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해 9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건설업자를 다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여기서 다소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사건을 송치 받은 수원지검은 K씨를 ‘하도급자’로 봐야 한다며 여주지청과 정 반대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K씨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건설업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K씨는 같은 검찰인데도 여주지청과 수원지검은 각각 상대방 진술에 따라 ‘근로자’와 ‘하도급 관계 당사자’로 판단하고 피고소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나의 지위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K씨는 4개월여 간 현장에서 근무하고도 임금조차 받지 못한 나는 대체 근로자인가 하도급자인가 알 수 없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고소인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현재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