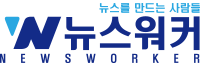6.4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잠잠했던 선거유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확성기 밖으로 터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합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몰릴지 사뭇 관심이 쏠린다.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지방선거의 향배가 그 속에 담겼다고 믿기 때문이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인을 심판하는 유일한 통로다. 4년의 정치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길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큰 관심으로 이들 정치인들을 돋보기로 살피 듯 세세히 들여다 볼 것이다. 크게는 세월호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 것이며, 작게는 지역 관내의 주요 사안에 대해 어떤 해법으로 풀어갈 것인지, 그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일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건설노조 추산 200만에 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얘기다. 70~80년대 건설근로자는 그 어떤 직업보다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결혼하고 싶은 남자의 직업 대상에서 오랫동안 상위에 랭크되는 직군이었다. 천지개벽의 대한민국 역사는 건설의 역사이며, 건설이 아니고는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없던 시절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심지어 근로자 자신조차도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 매몰되어가는 그런 부류로 전락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들만이 연래행사처럼 새벽인력시장에 들러 사진만 찍고 가는 곳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유권자이며, 이들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서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여전히 소외당하는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지금의 직업이 스스로에게 자랑의 직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 대한민국은 IT시대로 가파르게 변모해 갔다. 지금은 스마트한 세상이라고 표명되는 스마트폰 속 앱의 세상이 되고 있다.
반면 이들은 아직도 옛 시대의 고루한 방법만을 고집하며 살고 있다. 그들이 선망의 대상, 선망의 직군이 되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건설근로자들의 근로 형태를 IT라는 세상 속에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바로 첨단의 IT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을 제도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나브로 그들을 변화시켜가야 한다.
그들을 다른 삶으로 안내할 새로운 대안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창조경제를 주창하는 지금의 정부는 세계 속의 한국을 꿈꾸지만 내실이 부실한 구조라면 세계로 뻗어가지 못할 수 있다.
이에 한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 싶다. 근로자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만이 새벽인력시장이나 인력사무소에 가며, 그 안에서 일을 찾을 수 있다.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들이 새벽잠을 뒤로하고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다. 그들에겐 어제의 힘든 노역으로 채 풀지 못한 피로를 애써 지우며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안다.
만약 그들에게 하루 1~2시간만이라도 더 재울 수 있다면,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 피로는 행동을 둔하게 하며, 둔한 행동은 안전사고에도 무방비일 뿐 아니라 생산성도 현격히 감소한다.
하루 1~2시간이면 200만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들에게 이 만큼의 시간은 더 없는 행복이 될 수 있다.
지금의 기술로 하지 못하는 것은 없을 정도다. 그들에게 희망은 건설과 IT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하는 것일 수 있다. 하루 1시간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들에게 1시간은 고통의 해소이며, 생명의 담보이기도 할 것이다.
멀리 찾지 말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심하지 말자! 쉬운 방법을 놓고 돌아가지 말자! 그들이 나이가 많다고, 그들의 눈이 침침하다고, 그들의 손이 투박하다고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쓸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편리함, 안전함 그리고 저렴함을 선사한다면 그들은 변할 것이며 그 누구보다 먼저 IT의 전령이 될 것이다./

난 나의 글이 ‘바람’이기를 원하는 것은 오랜 글쓰기의 습관 때문인지도 모른다. 신문기사는 지나간 글에 대해 추억을 살릴 수는 있지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울먹임은 갖기 어렵다. 바람은 흐른다. 시대를 풍미했던 기사도 흐른다. 그래서 바람은 추억이 되고, 지나간 추억은 좋았건 나빴건 희미하다.
나는 나의 글에서 바람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바람소리는 때로 산들바람처럼 시원하지만, 격랑의 폭풍우처럼 거세기도 하다. 들녘에 부는 바람은 마른 풀잎사이를 지나며 야릇한 소리를 만든다. 바람은 지나고 다시 오지 않는다. 시대의 글이 그렇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