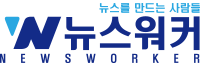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은 멧돼지과 동물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라고 한다.
두산백과 등에 따르면 ‘전염이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돼지 전염병이다.
사람을 포함해 멧돼지과 이외의 동물은 감염되지 않는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전파될 경우 양돈 사업에 큰 피해를 주는데 우리나라는 ASF를 제1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잠복기는 4~19일 정도로, 급성일 경우 치사율이 100%에 가깝다.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지역에서는 만성으로 발병하기도 한다. 모든 연령의 돼지가 감염되며 발병 후 갑자기 죽는 것이 특징이다. 전파 속도는 사육 형태나 관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병원성과 감염량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발열과 함께 장기와 피부 등에 충혈 및 출혈이 나타난다. 심급성형은 고열(41∼42℃)과 식욕결핍, 피부 충혈 등의 증상을 보이며 1~4일 후 죽는다.
본래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지역의 풍토병으로 2000년대 들어 유럽에 전파되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018년 1~5월까지 전 세계 14개국에 ASF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중 10개국이 동유럽과 러시아, 4개국은 아프리카 지역이다.
ASF가 결국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말았다. 확진된 이후 이틀 뒤인 18일 첫 발생지인 경기도 파주에 이어 인접한 연천 양돈농장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인다는 게 더 문제다.
정부가 파주 농장의 돼지 4700 마리를 살 처분하고 돼지농장과 도축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면 이동금지 조치를 내렸건만 방역망이 속절없이 뚫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ASF 유입경로를 세 가지로 추정한다. 돼지에게 오염된 먹이를 주었거나 농장 관리인들이 중국 등 ASF 발생국을 다녀왔거나, 아니면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것이라는 얘기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북한 지역의 야생 멧돼지가 최근 폭우에 휩쓸려 떠내려 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추가 구멍이 뚫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경색 국면인 남북관계에서도 ASF는 악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ASF가 번지는 상황은 남북이 협력해 방역에 나설 필요성을 일깨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방역협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에) 방역협력을 제안했는데 긴밀하게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SF는 지난 5월 북한 북부 자강도에서 발생했다. 북한이 발병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 보고한 직후 정부가 개성 연락사무소를 통해 방역협력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무응답 상태다.
이 때문에 자강도에서 시작된 ASF는 휴전선 부근까지 내려왔는지, 북한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초보적인 수준의 협력도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꼭 1년 전 남북은 전염병 등에 대한 방역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9월 평양공동선언)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방역협력 추진 필요성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발병 원인을 북한으로부터의 전염으로 추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파주시 농장이 북한과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창문이 없는 축사형태라 야생동물과의 접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장관도 “야생멧돼지 경로와 관련해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 (북한에서 확산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역에 재난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남북 간 방역협력은 필수적이다.
ASF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쓸쓸한’ 남북관계에 속 썩이는 애물단지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