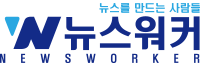-“저출산 문제 장기적 시각 필요…고출산 나라에서 배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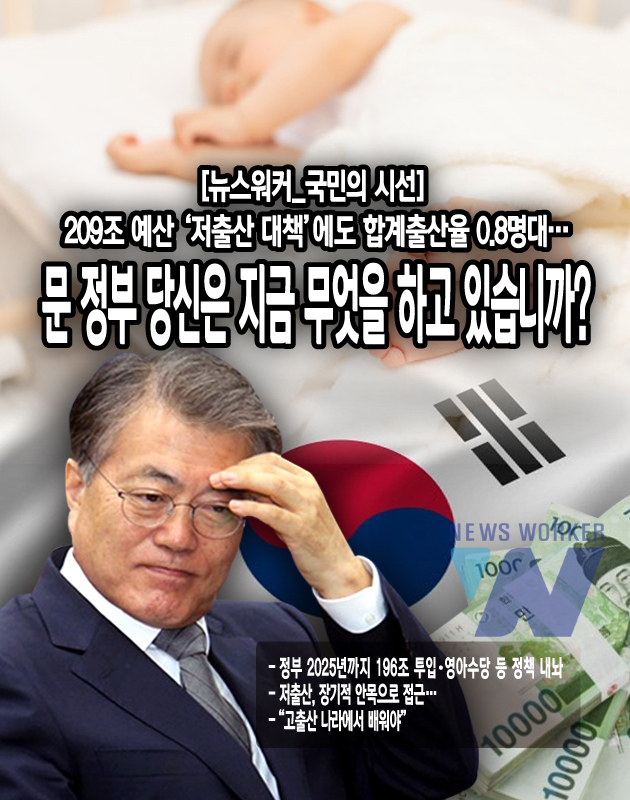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2020년은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첫해로 기록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5182만9023명으로, 2019년(5184만9861명)에 비해 2만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심각한 것은 출생아 감소다. 2020년 합계출산율이 최초로 0.8명대가 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209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 저출산 대응에도 지난해는 출생자수 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제는 ‘저출산의 덫’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풀 때가 된 시점이다.
지난해 출생자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을 기록했으며, 사망자(말소자)는 반등해 30만7764명을 기록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인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나타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2분기와 같은 0.84명이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을 단순 평균계산하면 0.86명.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세계 평균(2.4명)이나 유럽연합 평균(1.59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019년에도 0.918명에 그쳤다. 결혼이 출산의 선행지표처럼 여겨지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혼인 건수 감소가 저출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0년 3분기 혼인건수는 4만7437건으로 분기별 혼인건수가 5만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정부 2025년까지 196조 투입‧영아수당 등 정책 내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도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구가 줄면 경제 활력이 떨어짐은 물론 국내총생산(GDP)이 하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2021~2025년)간 인구 정책의 방향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선 임신‧출산 후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출생하는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을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부부 각자에게 월 30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다자녀 가구 대상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도 2025년까지 공급하고, 소득 8분위 이하(1~10분위, 숫자 높을수록 고소득)의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에 오는 2025년까지 196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에 현실적인 지원은 많이 포함됐지만, 저출산 문제의 핵심인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합계출산율 감소 경향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일 쏠림 등 삶의 어려움이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원인이나 그 영향은 사회, 경제, 문화, 심리 측면 등 매우 다층적이고 개인과 계층마다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며 “특단의 조치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저출산,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고출산 나라에서 배워야”
전문가들의 말처럼 저출산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결혼과 출산, 육아, 교육, 주거 등 생애 주기에 해결해야할 과제도 들여다 봐야한다.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일ㆍ가정 양립’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당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했었다. 그 후로 정책 마련과 예산 투입이 계속됐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실정이다.
아직 우리사회에서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분위기가 은연중에 깔려 있다.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ㆍ여성ㆍ정규직ㆍ임금근로자 위주로 사용되는 육아휴직을 남성ㆍ중소기업 근로자로 확대하고 휴직 기간 중 소득보장도 필요해 보인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남성 A씨는 두 아이가 있지만 육아휴직을 내 본적은 없다. 그는 “회사 방침과는 다르게 팀 내 분위기가 보수적이라 남성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곧 퇴사할 사람’으로 낙인 찍인다”고 푸념한다. 책과 영화로도 개봉된 조남주 작가의 <82년 김지영>은 우리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책도 보고 영화로도 봤다. 당시 필자의 영화 관람을 두고 40대 여성 B씨는 “(영화를 두고)현실도 그에 못지않은데 굳이 영화로까지 슬픔을 얹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영화 관람을 거부했었다.
유럽의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은 ‘저출산 과제’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었을까. 프랑스와 스웨덴은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 정도 높다. 2019년 기준으로 프랑스는 1.84명, 스웨덴은 1.7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라떼파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스웨덴은 1974년 서구 사회에서 처음으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성 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덕분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안정적 출산율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또 이들 국가는 ‘출산ㆍ육아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기치 아래 가족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았다. 낮은 출산율로 고민이 컸던 프랑스가 유럽 최고 출산율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성평등 정책과 문화, 사회보장제도 등 저출산 대응정책을 종합적으로 잘 시행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출산율이 안정화된 국가에서 배워야한다. 그들도 과거에는 낮은 출산율에 고심했지만 가사에 치우쳤던 여성을 노동시장에, 직장에 치우쳐 있던 남성은 육아에 참여하는 등 둘 간의 균형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제도‧문화적으로 힘쓴 결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었다.
‘역대 최저 출산율’에 낙심하며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모르는 길은 지도를 보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듯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는 뼈아픈 심정으로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것을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