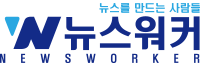건설일용근로자의 하루는 이렇다. 알람 벨이 울리던 울리지 않던 그들은 어김없이 새벽 4시면 일어나야 한다. 자의든 타의든 그들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어왔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스스로의 몸을 일으킨다.
뒤적뒤적 몸에 잠바를 걸치고 어깨에는 먼지가 가득한 검정색 배낭하나를 걸쳐 메고 밖으로 나선다. 버스 첫차는 4시 20분에 출발한다. 그 차를 타고 인력시장 또는 직업소개소까지 이동한다. 도착하니 새벽 5시다. 그들은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소개소 문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담배를 피워물고 소개소 직원이 오기를 기다린다. 기다리기를 5~10분이 지나면 소개소 문은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자신이 호명되기만을 기다린다. 새벽녘이라 근로자들끼리 대화도 별로 없다. 그저 기다리며 부족한 잠을 청해볼 뿐이다.
그러기를 30여분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현장을 배정받는다. 일당은 9만원이지만 10%인 9천원을 빼면 8만천원이 남는다. 하지만 현장까지 가는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면 6천~7천원을 또 빼야 한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푸념과 하소연과 욕소리 등등을 듣거나 내뱉고 나서 손에 쥐는 돈은 7만5천 원 정도, 이 돈으로 저녁을 해결해야 하고, 가끔 소주도 한잔 해야 한다.
하루가 팍팍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기 때문일까.
가끔 몇 천원 더 준다는데 가 있어 일을 배정받고도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한다. 5천원이면 큰돈이다. 이리 뺏기고 저리 떼이면 고작해야 몇만원인데 한달을 꼬박 일해도 그 생활이 나아질리 없다. 괜히 약값만 더 들 뿐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는 사람은 직업소개소다. 소개소 입구에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일당에는 구직자 수수료 4%와 구인자 수수료 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든 것일까. 그들은 9만원으로 알고 일을 하는데, 일당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만든 법일까. 분명 근로자들이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 교통비도 떼이고, 수수료도 떼인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고용노동부와의 인터뷰에서는 그것이 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라는 말인가?
모호한 질문일까. 애매한 답만 돌아온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우리나라에는 건설근로자가 장비를 포함해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200만명이 모두 피해자는 아닐 것이다. 아니 합법도 불법도 아닌 이 틈바구니 속에 200만 명 모두가 피해자가 아닐지 모른다.
분명한 건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 개선해야하며, 누군가가 도움을 주려할 때, 적극 자기주장을 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는다. 그냥 그렇게 살 뿐이고,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