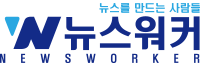![계속된 고금리 기조와 경기 불안정으로 서민들이 생계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채무조정에 나섰다. 이달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에 따르면 햇살론 등 정책상품을 연체한 소상공인 및 근로자에게 1년까지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까지 상환유예 혜택을...[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410/352577_364330_5923.jpg)
[편집자주] 서민을 위한 금융대출은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정책대출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및 디딤돌 대출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및 소액생계비대출이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한다. 올해 저출산 극복방안으로 최초 도입된 신생아특례대출도 뜨거운 반응과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욕구를 자극했다. 그러나 아직 혼란스럽고 체계적으로 미비한 정책대출로 인해 여전히 ‘대출 난민’은 발생하고 있다. 총 네 편의 연재를 통해 주요 정책대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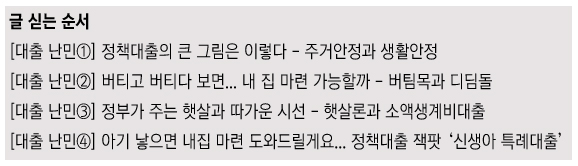
서민빚 대신 갚아주는 정부와 비판 여론
취약계층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대출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 원을 넘어섰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자주가 증가하면서 보증을 선 정부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늘어나고 있다. 연체자가 늘어나면서 신용불량자 속출을 우려한 정부는 생계유지의 최저선을 보장해주기 위해 상환유예부터 금융지원까지 다양한 구제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여론이 형성됐고 건전한 금융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빚 못갚은 서민 위해 정부가 쏟아부은 1조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표적인 정책상품에는 햇살론과 소액생계비대출이 있다. 햇살론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대출금 500만~2500만 원을 지원하며 금리는 10% 내외로 책정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16%에 가까운 금리로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 같은 정책상품은 정부가 원금의 약 90%를 보증하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불충분한 취약차주가 발생하면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달 9일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햇살론 등 정책상품의 대위변제액은 총 1조 551억 원으로 집계됐다.
햇살론 중에서도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의 대위변제액은 359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중은 25%를 차지했다. 이외에 직장인을 위한 근로자햇살론(3398억 원), 취약차주의 은행권 진입을 위한 햇살론뱅크(2453억 원),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420억 원) 등도 적지 않은 규모의 대위변제액이 발생했다. 대위변제는 대부분 세금으로 실행된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연체율이 26.9%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5.2%포인트 상승했고 연체액은 2063억 원에 달했다. 대출 재원이 기부금과 대출회수금, 이자수익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이처럼 연체액이 증가하면 추후 운영이 불투명해진다. 소액·긴급 지원형식으로 큰 수요를 이끌었던 정책상품이지만 환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던 셈이다.
연체자 5만명 감싸주고 신용불량도 막아주는 정부
계속된 고금리 기조와 경기 불안정으로 서민들이 생계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채무조정에 나섰다. 이달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르면 햇살론 등 정책상품을 연체한 소상공인 및 근로자에게 1년까지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까지 상환유예 혜택을 확대해 그 대상이 총 5만 명에 이른다.
또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2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넓혀 창업한 청년도 포함키로 결정했다. 1년 미만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그 대상은 1만 명, 추가 예산만 600억 원에 달한다. 3%대 금리로 청년층 수요가 높은 만큼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청년 신용불량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 5887명으로 근 3년간 25% 증가했다. 30대 이하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 신용불량자는 20만 명을 훌쩍 넘는다. 정부는 올해 2000억 원이었던 햇살론유스의 공급계획을 3000억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서민금융 핵심인 정책상품의 연체액을 대신 갚아주거나 상환유예 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면, 대출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대출 재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취약계층 서민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세금 누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대출로 혈세 눈덩이... “성실하게 빚갚는 사람들은 바보냐”
햇살론 등 정책상품 대위변제로만 1조 원을 넘게 소요하고, 갈수록 정책대출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차주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부는 혈세로만 메우고 있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평가다. 각종 언론매체와 커뮤니티에서는 “성실하게 빚갚는 사람들은 바보냐”며 비난 섞인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대출이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진단한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고금리 형태의 금융상품은 애초에 취약계층이 갚기 힘든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보증을 해주다 보니 상환의무에 대한 낮은 책임감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앞으로 서민금융정책의 재정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인 햇살론 및 소액생계비대출과 이에 따른 현주소를 알아봤다. 마지막 4편에서는 올해 정부의 저출산 극복정책이자 내 집 마련의 필두로 등장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