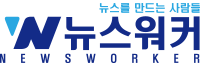[뉴스워커_김영욱 시사칼럼니스트] ‘아세안+3 정상회의(ASEAN+3 Summit)’는 1997년 출범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사아를 포괄하는 ‘동(東)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지역협력체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안보 및 자주독립 노선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지역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두산백과·청와대 순방매뉴얼 등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형성되면서 세계 경제의 지역화가 빠르게 확산되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빈 모하맛 총리는 동남아와 동북아가 참여하는 ‘동아시아경제회의(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를 제안하였다.
당시 미국의 반대와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되었던 동아시아공동체는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동북아 3국(한국·중국·일본) 정상을 초청하는 형태로 ‘아세안+3’ 체제를 출범시켰다.
‘아세안+3’ 체제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골자로 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이후 아시아와 글로벌 경제위기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성공했다.
‘아세안+3’ 체제는 동남아와 동북아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협력체로 1997년 첫 회의 이래 정상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며, 동남아 국가에서 회의가 개최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이 회의에서 한·중·일 3개국은 정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결정권은 없으나, 지역의 상호 관심사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필자도 고(故) 노무현 대통령 집권 때 청와대 출입기자로 지난 2004년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제8차 ‘아세안+3’ 정상회의를 취재한 경험이 있다.
이때 우리나라는 ‘북핵(核) 문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을 확보하자’는 회담 전략 처음으로 세웠다.
국제적인 화두인 ‘북핵’ 해결과 관련, 내년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2019년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의 동의로 회의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초청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주목되는 제안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제안이 성사된다면 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무대가 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쳐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의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미국과 한국에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대화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무기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협상의 장기화로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에서 기 싸움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정확한 북핵 리스트를 내고 검증받겠다고 하면 대북 제재는 완화가 아니라 해제될 수도 있다. 미·북 수교와 대북 지원도 이어진다.
김 위원장은 당장 올해 안 남북정상회담과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청산’의 단초를 풀어야 한다.
또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정상 회담장에 당당히 나와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국제사회 일원임을 밝혀야 한다.
김 위원장은 동아시아 협력 고리체인 ‘아세안+3’에서의 북핵 해결의 중요성과 무게성을 똑바로 지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