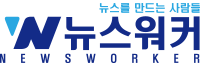[기업진단_이필우, 김준식 기자] 2015년 1월 5일. 서울 광화문에 은행과 증권, 보험 지점을 결합한 1호 복합점포인 ‘광화문 NH금융플러스센터’를 열 때만 해도 NH금융지주의 기대감은 상당했다. 231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한 농협은행과 기업금융(IB)을 선도하던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의 시너지 폭발로 ‘미래의 밥’이 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3년여가 흐른 현재 복합점포는 NH금융지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시너지는 고사하고 직원 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어색한 동거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렇다 보니 여타 금융지주에 비해 복합점포수 자체도 적지만 증가 추이도 더딘 상태다.

NH금융지주의 복합점포는 올 6월말 기준 13개소로 가장 많은 신한금융지주(65개소) 대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신한금융지주(65개소)와 KB금융지주(56개소)가 2017년 말 대비 올 6월말까지 복합점포수를 각각 15개소, 6개소 늘리는 동안 NH금융지주는 2개소 늘리는데 그쳤다. 아울러 복합점포 개설이 더딘 하나금융지주(22개소)와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금융지주들이 비대면 채널 확대로 기존 점포를 빠른 속도로 폐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국 각지에 복합점포를 늘리고 있는 것은 운영비용 절감, 결합상품 등에 관심이 높은 고액자산가 유치 등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NH금융지주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쫒지 못하면서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럼 NH금융지주의 복합점포가 기대와 달리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금융권에서는 농협은행이 가진 특수성을 공통적으로 꼽는다. 농협은행은 농민의 수익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특수은행이다 보니 서울보다는 지방에 두터운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고액자산가 비중이 낮아 WM(고액자산관리)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NH투자증권는 우리투자증권 시절부터 1억 원 이상 고액자산가를 10만 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만큼 WM에 강점을 보여 왔다. 보통 은행과 증권이 협업한 복합점포의 영업 형태가 고객을 교류하는 식인걸 고려할 때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사실상 농협은행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만한 게 없는 셈이다. 또한 농협은행의 상품 포트폴리오가 NH투자증권의 고액자산가를 유치하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 시너지가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NH금융지주가 1조원을 넘게 들여 1등 증권사를 사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활용법을 몰랐고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NH투자증권과 농협은행의 영업 환경과 역량,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억지춘향으로 결합해 놓다 보니 불협화음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자산가치제고협의회와 같은 보여주기 식이 아닌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NH금융지주가 복합점포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