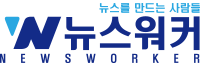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70대가 병원 응급실을 12군데나 헤매다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0시30분경 경기 용인시 모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74세 보행자가 후진하는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당시 구급대는 신고 접수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 환자 이송을 시작했으나 용인은 물론 수원, 안산 등 인근 병원 11군데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환자는 신갈의 한 병원에서 1차 응급처치까지는 받았지만 병실이 부족해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다. 의정부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겨우 받은 구급대는 급히 차를 돌렸지만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은 고령의 환자는 심정지를 일으켰고 결국 사망했다.
의료진 및 병상 부족을 이유로 환자를 '뺑뺑이' 돌리는 안타까운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전문의 부족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대구의 10대 소녀가 판박이 같은 상황을 당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사태가 터질 때마다 의료계에서는 핵심진료 인력 누수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진 점이 없다는 데 대한 국민의 충격과 공분이 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소방청 집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만 환자 재이송 과정 중 심정지 사례가 상반기 6건이나 나왔다. 서울과 지방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면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례는 더 늘어난다.
관련 소식을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착잡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ID가 'bong****'인 시민은 "응급실 뺑뺑이가 내 가족 일이라고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데 너무 무섭다"고 전했다. 한편에서는 "필수의료에서 일할 환경 좀 만들어라. 의사 늘려봐라 어느 과 가겠나. 요즘은 레지던트도 안하고 피부과 병원 차린다"(juno****) 등 필수의료 인력이 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죽을 수도 있는 환자도 일단 받아 치료하도록 법적 환경을 만들어야지"(jini****), "거부하는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 내리면 해결된다"(bark****) 등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최근 의사와 간호사로 나뉘어 대립하는 간호사법 문제와 연관지어 관련법이나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툭하면 멱살잡고 고소하고. 위험한 환자 받아 여차하면 의사 면허취소까지 되는데 누가 받나"(msya****) 등 일부 시민은 빈발하는 의료진 폭행 및 협박부터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응급실 난동을 엄히 다스려야 의사가 환자를 받고 치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많은 시민이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