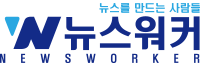국내 제약업계, 미국 현지 생산·기업 인수로 관세 위기 돌파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으로 눈을 돌려 제약업계에 불어닥친 트럼프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방법을 꾀했다.
![제약기업 셀트리온 CI [사진=셀트리온]](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09/396316_424018_2338.png)
셀트리온은 이달 23일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의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생물의약품 공장, 제약기업 임클론을 3억3000만 달러(약 462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회사는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보, 관세 노출의 조기 차단이 인수의 주요 목적임을 밝혔다. 또 인수 완료 후 설비 업그레이드와 증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9일 미국 제약사와 13억 달러(약 1조8200억원) 규모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2월까지다. 아울러 2023년 6월 화이자와 바이오시밀러(특허가 만료된 약품의 복제약) 생산 협력을 발표하며 미국 소비자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넓혀 왔다. 이번 계약은 대미 통상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수요를 선제 확보한 사례로 평가됐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이번 달 2일 미국 바이오텍과 후기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이어지는 위탁생산 계약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계약이다. 앞서 6월 19일에는 영국 오티모 파마와 항체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2023년 1월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뉴욕 이스트시러큐스 공장을 1억6000만 달러(약 2240억원)에 인수해 북미 거점을 마련했고, 해당 부지를 북미 운영 허브로 삼았다.
![제약업계의 약품 [사진=인공지능(chatGPT) 생성 이미지]](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09/396316_424020_2727.png)
이러한 제약업계의 미국 진출은 여러 이유가 있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왔다. 종합하면, 미국 내 생산력을 갖추면 관세·통관 변수에 덜 흔들리고, 실사·허가 과정에서 대응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현지 인력 채용을 통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운용 경험과 기술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일례로 셀트리온은 인수한 설비의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시장성도 배경에 있다. 비만·자가면역 등 대형 품목이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했고, 미국 고객사는 미국 생산 선호 성향이 강해졌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이은 대형 수주로 누적 계약 규모를 키웠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거점을 기반으로 후기 임상 물량을 상업 생산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셀트리온은 미국 공장 인수로 공급망을 현지화하며 관세 위험을 낮추는 전략을 택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은 인수·계약·공장 매입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과 품질 체계를 확장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주 거래처가 미국 생산을 선호해 수주 경쟁에서 불리함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지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스템 통합과 일관성 확보가 중요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셀트리온제약, 이중 페이로드 ADC ‘CTPH-02’로 항암치료 새 가능성 열까?
- 셀트리온제약 청주공장 PFS 생산시설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나?
- 롯데, AI 혁신과 글로벌 사업으로 미래 준비
- 세계는 지금 비만약 전쟁...동아ST, 위고비 약진에 ‘DA-1726’으로 승부수
- 후발주자 마운자로, 비만치료제 시장 도전장...위고비, 종근당 손잡고 국내 1위 굳히기 나섰다
- aT, 추석맞이 취약계층 대상 따뜻한 ‘나눔’ 실천
- “미국 공장 없는 회사 의약품 관세 100%”…트럼프발 제약 쇼크, 국내 제약사 온도차 뚜렷
- 토요타, 韓 관세협정 지지부진한 사이 역대 최대 실적…국내 자동차 업계, APEC서 반격 기회 잡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