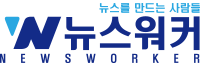사고 후 공사 재개 3개월 만에 사망사고 발생
모 건설사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공사 현장에서 또 한 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8월 의정부 아파트 현장 추락사 이후 석 달 만에 그룹 계열 현장에서 다시 사망 사고가 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그룹 차원의 안전 관리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와 해양경찰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39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해상에 위치한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 공사 현장에서 선원 한 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에 따르면 숨진 이는 현장 작업자가 아닌 바지선 선원으로, 이날 오전 바지선을 계류·고정하는 작업 도중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바다에 빠진 뒤 뒤늦게 발견됐디.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아직 불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회사 설명은 ‘하역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호스를 맞아 바다로 추락했다’는 취지로 전한 일부 초기 보도와 상이했다.
사고 현장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는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1단계 2공구) 구간이다. 방파호안 길이만 916m에 이르는 대형 해상 토목 공사로, 케이슨 20함 제작·설치와 매립재 운반 등 고위험 공정 비중이 높다. 공사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8년 6월까지로 잡혀 있다.
이번 사고는 올여름 의정부 재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사에 이어 같은 그룹 계열 현장에서 다시 벌어진 사망 사고다. 사고 직후 회사는 전국 80여개 현장 공사를 한때 모두 멈추고 안전 점검에 들어갔지만, 공사 재개 3개월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난 셈이라 그룹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다.
통계상으로도 건설 현장은 여전히 산재 사망의 ‘최전선’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통계를 보면 올 1~6월 기준 사고사망자는 287명으로 전년보다 9명 줄었지만, 이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는 138명으로 오히려 8명 늘었다. 전체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 비중은 48%로 절반에 육박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현장에서 위험은 더 크다. 같은 통계에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자는 176명으로 전년보다 21명 늘어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111명으로 30명 줄었다. 진해신항 공사처럼 대형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현장도 실제 작업은 하청·재하청과 소규모 장비업체으로 쪼개지는 구조여서, 제도상 대형 건설사 현장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사고 패턴이 반복된다는 업계의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와 창원해경은 작업 계획, 위험성 평가, 안전장비 착용 여부, 하청업체 관리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선박이 항구에 정박한 모습 [사진=Pixabay]](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11/402983_433733_3656.jpg)
특히 계열사 사망 사고 이후 그룹 차원의 안전 강화 계획을 내놨던 진해신항 현장에서 어떤 보완 조치를 실행했는지, 그 조치가 이번 사고 공정에도 실제 적용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과 준설토투기장, 컨테이너 부두 등 토목 턴키 공사는 공사비만 3조원 안팎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해당 건설사는 남측 방파호안 2공구 대표사로 참여해 향후 배후단지·하부공 입찰에서도 존재감을 키우려 했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반복되면 평가위원회에서의 감점, 발주처의 관리 강화 등으로 사업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시공사와 발주처, 감독 당국이 어떤 수준의 구조적 보완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진해신항 공사 현장은 국내 대형 인프라 공사의 안전 기준을 다시 짜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