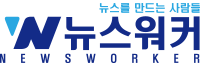전력·물·열섬·소음 등으로 주민들 기피 경향 심해
주택 분양과 토목 수주가 식어가는 사이, 대형 건설사들은 데이터센터를 새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전력, 설비 인프라가 대부분 사람이 많은 지역과 맞닿아 수주 이후에도 인허가와 주민 반대라는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의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 [사진=현대건설]](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11/403265_434141_336.jpg)
현대건설이 최근 경기도 용인 죽전에 준공한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는 건설사의 데이터센터 투자 경향을 상징하는 사례다. 이 시설은 IT 설비에 투입되는 전력이 64메가와트(MW), 전체 수전 용량이 100MW로, 하루 동안 16만~20만 가구가 사용할 전력을 한 시설에 끌어다 쓰는 규모다.
퍼시픽자산운용과 해외 연기금이 참여한 1조3000억원대 사업에서 현대건설은 설계부터 고밀도 서버 랙, 대형 발전·냉각 시스템 등을 통째로 설계·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DL이앤씨도 서울 금천구 가산동 데이터센터를 준공하며 데이터 인프라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연면적 17만㎡ 규모에 수전 용량 20MW급으로, 건물 시공뿐 아니라 내부 장비·시스템 설치와 시운전까지 포함하는 커미셔닝 업무를 수행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데이터센터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이유는 분명하다. 반도체, 인터넷 기업,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가 앞다퉈 국내에 서버 투자를 늘리면서, 건당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좋은 만큼 리스크도 크다. 과거 네이버가 용인에 계획했던 제2 데이터센터가 일부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돼 세종으로 옮겨간 사례처럼, 수주 이후에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 자체가 멈출 수 있다.
![현대건설은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를 시공하며 PUE를 강조했다. [사진=현대건설]](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11/403265_434143_442.jpg)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전력과 안전 문제다. 수십MW급 데이터센트는 변전소와 고압 송전설비가 필수라, 고압선 전자파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해서 제기됐다.
용인 기흥 일대 데이터센터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대책위원회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디젤 비상발전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대규모 설비의 폭발 가능성을 한꺼번에 문제 삼으며 데이터센터를 도심 한복판의 ‘위험 시설’로 생각하는 인식을 드러냈다.
환경 부담도 논란이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서버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열을 뿜어내는데, 이를 식히는 냉각 설비에 전체 에너지의 절반가량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연구와 통신사 자료를 보면 컴퓨팅 장비에 쓰이는 에너지보다 냉각용 에너지가 30% 이상 더 많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AI 서버가 늘수록 이 비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일부 냉각 방식은 하루 수만 명이 쓸 물이 증발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전력만이 아니라 물과 열까지 지역 인프라에 부담을 주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주민들 [사진=인공지능(DALL-E) 생성 이미지]](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11/403265_434152_917.png)
이러한 님비(Not In My Backyard, NIMBY) 현상을 돌파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꺼내든 첫 카드는 에너지 효율, 특히 전력 사용 효율(PUE) 개선이다. 현대건설은 용인 죽전 데이터센터에는 외기를 활용한 냉방과 고효율 냉각 설비, 설비 간섭을 줄인 설계로 국제 기준에서 비교적 낮은 PUE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물과 열에 대한 우려로 하이브리드 냉각 같은 신기술도 동원된다. 하수나 댐 심층수를 활용해 센터 온도를 최대한 내리고, 공기냉각과 수냉식을 조합해 물 사용량을 가급적 줄이는 실증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업에서는 데이터센터에서 나온 폐열을 지역난방이나 온수 공급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소음과 전자파, 재난 우려에 대해서는 구조와 배치에서 해법을 찾는 흐름이다. 고압 변전설비와 대형 냉각 장비를 지하나 건물 중앙에 두고, 외곽에는 도로와 녹지, 완충 녹지대를 배치해 주거지와 거리를 벌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기술만으로는 님비를 다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용인·김포·시흥 등에서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설계와 수치를 아무리 설명해도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전자파·소음·열을 사전에 측정·시뮬레이션해 공개하고, 비상 상황 대응 시나리오와 보험·보상 체계를 설명하는 등 ‘기술+소통 패키지’를 내놓고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돌리려 하고 있다.
- SK텔레콤, 매출 감소에도 AI·데이터센터 사업으로 돌파구 찾나?
- SK그룹, 엔비디아와 협력한 ‘제조 AI 클라우드’ 구축 내용은?
- 김성일 도의원, AI 거점 노리면서 전남도 AIㆍ데이터 전문인력 ’0명‘
- LS ELECTRIC, 북미 AI 빅테크와 1,329억 원 규모 전력 공급 계약 체결 내용은?
- 안도걸 의원, "광주 AI 시범도시 도약과 송정역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지역 현안” 대책 주문
- 김정희 교육위원장, “AI 데이터센터 유치 성과, ‘전남형 협치’로 지역 발전 이어가야”
- DL건설, 가산 AI 데이터센터 시공의 핵심 특징은?
- 18일에만 1.6% 하락 ‘에이피알’, “MSCI 한국지수 편입”되어도 …높은 메디큐브 의존도에 내년은 걱정, 美 FDA 신고 · 필리핀 무허가 대응 리스크
- AI 시대 연료로 떠오른 LNG…포스코인터·SK는 20년 큰 그림, 개인은 인버스로 '숏'
- 삼성물산·LG에너지솔루션 등 韓 기업 올라탄 AI 호황...전력망·데이터센터·배터리까지 ‘버블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