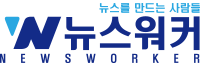지난 2019년부터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몽니에 한국 반도체가 발목 잡혀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시기에 ‘Original Korean’을 주창하는 국내 저축은행이 하필 이 시기에 일본 자회사에 대출채권을 넘긴 것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 들어선 일본계 대부업이 어떻게 해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2002년 대부업을 제정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의 규제 장벽이 낮았고, 금리는 높아 일본 사채업자들이 국내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일본계 저축은행이 진입하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으로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제1금융권에서 이미 대출이 막혀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다.
국내에선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는 일본계 대부업이 국내에서 뿌리내릴 수 있었던 배경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대출 금액을 확대하는 ‘재투자’ 방식을 통해 영업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
국내 대부업 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일본계 대부업의 총 대부자산은 6조7천억 원으로 전체 대부업의 0.2%를 차지했다.
음지에 있던 대부업에서 출범한 일본계 저축은행들은 고객지향적인 금융서비스로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듯하다. 일본계 저축은행은 국부유출 의혹이 따라다니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의 화살을 빗겨가고 있다. 물론 일본의 자본 규모와 여신관리 등에 특화된 경쟁력으로 국내에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비친다.
일본계 저축은행들은 국내 시장진입에 성공했고 일본법인 자회사로 매각된 대출채권의 수익금을 재투자해 영업을 확장함으로써 ‘언젠가는’ 일본으로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국부유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부실채권(NPL)을 매각할 때 정부의 법적인 정책과 규제가 있느냐를 묻는다면 “없다”가 답이다. 민법상 채권매각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어 금융권은 행정제도를 준수할 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성은 없다.
보통 채권매각은 공개 입찰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개 입찰은 공식적인 평가기관의 채권심사가 이루어지고, 수의계약은 자회사인 대부업으로 매각하지만, 가격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만일 금융회사에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신용대출의 부실 영업을 했다는 증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저축은행마다 대출채권 매각방식은 각사의 규모에 따라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내부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찾을 수 없다. 이는 대출채권 매각의 절차상 법적인 기준이 모호해 단지 일본 자회사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해당 저축은행에 도의적인 책임만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 대출채권을 매각하면 채권자가 달라지는데 이를 채무자에게 알릴 의무는 현재까지 없었다. 이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채권양도 시스템을 구축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기회가 됐다. 이로써 채무자의 알 권리(?)를 실현한 정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에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올해 3월 21일 재정되어 21년 3월 25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채권매각은 독립법인체로 매각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기존 고객들의 자산 보호책임을 더 낮게 측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실 금액 같은 경우 기존 고객들에게 전가돼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자산 가치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본계 저축은행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국부유출 논란’은 윤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내에서 자산 유동화 회사 또는 제3자가 채권을 회수하면 수익금이 발생해 국내에 재투자될 수 있으나 일본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면밀히 들여다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