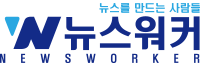기존 삼원계 배터리(NCM/NCA) 대신 LFP 배터리가 강세일지 주목받기도
배터리 제조 업계는 다가올 연말에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국 배터리 3사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설지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렸다.
![전력거래소 CI [사진=전력거래소]](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10/399682_428945_2226.jpg)
전력거래소가 약 1조 원 규모의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공고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 초에 낼 예정이다. ESS는 전기가 남을 때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꺼내 쓰는 대형 배터리 설비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 총 540MW(메가와트) 규모의 이번 2차 입찰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주류로 부상할지 가늠할 분수령으로 주목된다.
앞서 540MW(3240MWh, 메가와트시) 규모로 치러진 15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의 1차 입찰은 NCA(삼원계, 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배터리를 내세운 삼성SDI의 승리로 끝났다. 삼성SDI는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확보했는데, 국내 생산 가점 등 비가격 지표의 우위가 결정적이었다.
2차 입찰 역시 6시간 방전 기준(3240MWh)으로,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력거래소는 1차보다 비가격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산화 여부가 여전히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시장 환경은 1차와 달라졌다. ESS 화재 이력 등으로 LFP의 강점인 가격 경쟁력과 열안정성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NCM(니켈·코발트·망간) 또는 NCA는 니켈 비중을 높여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 설치 면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NCM, NCA는 코발트 등 고가 광물을 쓰고 열관리에 민감해 가격 부담과 화재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LFP는 철(Fe)을 기반으로 해 가격이 저렴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라 열 폭주 위험이 낮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더 큰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
![지난 ESS 입찰 당시 반영했던 가격지표와 비가격지표 [사진=전력거래소 발표자료]](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10/399682_428944_1943.png)
이에 국내 배터리 3사의 전략도 엇갈린다. 삼성SDI는 1차전의 주역인 NCM/NCA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수성에 나선다. 강화한 안전성과 신형 제품(SBB 1.5)으로 기술 우위를 지키며 중장기 LFP 로드맵을 병행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차에서 중국산 LFP를 내세웠으나, 2차에서는 약점으로 지적된 '국내 생산' 카드를 적극 검토한다. 비가격 가점을 확보해 LFP의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SK온 역시 LFP로 1차전의 부진을 씻고 재도전에 나선다. SK온은 2026년 하반기부터 미국 조지아 라인 전환 등을 통해 단폭셀 중심의 ESS용 LFP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2차 ESS 시장의 향방은 국내 생산 기여도의 반영 폭이 가를 전망이다. LG엔솔과 SK온이 국산 LFP 카드를 현실화할 경우, NCM/NCA 계열 배터리를 보유한 삼성SDI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의 LFP와 국산화 기여도의 NCM/NCA 간 재대결"이라며 "입찰 결과에 따라 국내 ESS 배터리 표준의 축이 기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포스코퓨처엠, LMR 양극재 양산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 [뉴스워커_IB탈탈털기] 재무 '빨간불' SK온, 23조 빚더미, IPO로 탈출 가능할까?
- [분석] LG엔솔, 삼성SDI, SK온..놓친 건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K배터리, LFP 전략 실패의 교훈
- 포스코퓨처엠은 CNGR과 어떻게 LFP 양극재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나?
-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ESS 정책 급제동…정책 승선 기업 삼성SDI·LG엔솔·SK온 영향은
- 리튬 안전성 논란에 나트륨 급부상…앞서가는 중국, 한발 늦은 LG엔솔·SK온·삼성SDI 잰걸음
- 美 알루미늄 공장 화재로 자동차 공장 줄줄이 가동 중단…현대차·SK온 등 국내 기업 온도차
- 삼성SDI, 테슬라 ESS 배터리 공급 논의…전기차 시장 둔화·탈중국 흐름 타고 도약할까
- 케이이엠텍, 삼성SDI 배터리 기술 유출 의혹 전면 부인...검찰·산업부 판단 엇갈려 진흙탕 공방
- 테슬라·벤츠 중국 벗어나 공급망 다각화...LG전자·삼성SDI 도약판 마련될까
- 리튬인산철 폐배터리 제도권 편입…셀 3사·포스코퓨처엠, 재활용 시장 물꼬 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