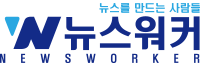1200만 관중 시대, 온라인 암표 96.6%가 KBO 티켓, 해법은 없나?
![암표의 완전한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은 제한적이고, 기술 발전 속도는 규제 속도보다 빠르다. 1000만 관중 시대에 수요를 줄일 방법도, 없는 야구장을...[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10/399185_428388_3031.jpg)
“한 경기에 2500만 원 벌어서 결혼자금으로 썼다.”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군 한 블로거의 당당한 고백이다. 2025년 KBO는 관중 1200만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흥행을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는 암표라는 그림자가 짙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프로스포츠 온라인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5만 1천402건. 그중 KBO리그가 96.6%, 포스트시즌 암표는 64.8%였다. 역대 최고다. 그런데 실제 처벌은? 거의 없다. 암표 거래 문제로 소환했던 ‘티켓베이’ 운영사 대표는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
이런 와중에 한화와 삼성의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는 대전에서는 매크로를 이용해 프로야구 티켓을 암표로 팔아치운 40대가 불구속 입건되었다. 2년간 순이익만 3억 1천200여만원. 현재 주 신고센터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한국시리즈 티켓에 대해 플레이오프 기간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암표 문제의 시장주의적 접근 vs 규제정책적 접근, 단편적 시각으로 접근 가능한가?
경제학 바이블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그레고리 맨큐는 교과서에서 암표를 "시장이 자연스럽게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가격이 올라간 만큼의 효용을 보는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분배된다고 한다. 시장주의자들에게 규제야말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규제정책학은 다르게 본다. 이건 ‘시장실패’다. 매크로 프로그램 쓰는 암표상과 손가락으로 예매하는 일반 팬 사이엔 기술 비대칭이 존재한다. 중고나라에서 3000원짜리 자동 예매 프로그램이 거래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은 허구다.
그러나 규제정책이 만능은 아니다. 1973년 경범죄처벌법은 오프라인 암표상만 상정했다. 2021년 공연법은 매크로를 금지했지만, 증명이 불가능하다. 공연법에는 문체부 장관의 ‘노력 의무’만 있을 뿐 처벌 조항이 없다. 규제정책론에서 말하는 ‘집행 불가능한 규제’. 이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구단의 자구책도 딜레마다. 본인 인증을 강화하면 선량한 팬만 고통받는다. 아이유 콘서트에서는 SNS 표현 문제로 입장이 거부됐고, ‘아버지 입원으로 못 가는데 동생한테도 못 준다’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암표상을 잡으려다 팬들을 옥죈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1000만 관중도 유지를 못 한다.
암표 - 전 세계적 현상, 해외는 어떻게? 일본과 미국, 정반대로 간 두 나라
일본은 2019년 강력한 처벌법(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을 도입했다. 하지만 진짜 무기는 따로 있다. 공식 재판매 플랫폼 ‘티케트레’에서 정가로만 거래하게 하고, 취소 불가 제도로 투기꾼에게 금전 리스크를 부여했다. 표를 사재기했다 못 팔면? 환불도 안 된다. 암표 동기 자체를 제거한 것이다.
미국은 정반대로 갔다. 재판매를 합법화하되 면허제와 가격 상한제로 틀을 만들었다. MLB는 ‘스텁허브’ 같은 플랫폼을 공식 인정한다. 시장에 맡기되, 규칙은 정한다.
최근엔 ‘동적 가격제’가 주목받는다. 수요에 따라 티켓값이 실시간 변동하는 시스템이다. 이론적으론 완벽하다. 가격이 수요를 반영하니 차익이 적어져 암표상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브루스 스프링스틴 콘서트에서는 티켓값이 수천 달러로 폭등했고, 미국 대학 스포츠는 4주간 327번 가격이 바뀌었다. 결국 2024년 법무부는 티켓마스터를 반독점 제소했다. ‘돈 있는 팬만 온다’라는 비판. 효율성은 달성했지만, 공정성은 무너졌다.
완벽한 해법은 없다. 중요한 건 ‘집행 가능한 규제’와 ‘시장의 지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우리에게 맞는 차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암표의 완전한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은 제한적이고, 기술 발전 속도는 규제 속도보다 빠르다. 1000만 관중 시대에 수요를 줄일 방법도, 없는 야구장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다.
단기적으로는 집행 가능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공연법의 ‘장관 노력 의무’를 ‘처벌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 티켓베이 같은 재판매 플랫폼 자체를 통제 가능한 영역에 두는 것도 논의된다. 현재는 플랫폼이 ‘우리는 중개만 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다.
KBO가 운영하는 공익 신고제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암표상을 신고하면 그 자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인데, 정규 시즌 중 71명이 혜택을 받았다. 경제적 유인을 활용한 자율 단속이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하되 한국화할 필요가 있다. 공식 재판매 플랫폼을 도입하되, 정가로만 거래하게 할 것인지 일정 수준의 웃돈을 허용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차피 이럴 바엔 ‘합리적인 재판매는 허용해야 한다’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말한 ‘취소 불가 제도’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정당한 사유로 못 가게 된 팬들을 위한 예외 규정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팬 사이트의 여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암표상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처벌우선주위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처벌은 동기부여를 막을 목적이다. 안 그래도 격무에 시달리는 행정력을 고작 암표상 잡는 데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뉴스워커_스포츠] 기아 타이거즈의 절망, 올 시즌 역대 최악의 우승 징크스 기록할 듯...
- ‘이기야’ 일베 논란에 혼쭐난 임시현, 마녀사냥인가?...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 [뉴스워커_스포츠] 벌써 8골.. 호날두 보고 있나? 날아다니는 손흥민, 잘하면 메시도 뛰어넘겠는데?
- [뉴스워커_스포츠] 배구 ‘신인감독 김연경’ 첫 화부터 언어폭력 논란, 자극성 수위 도마 위에...
- [뉴스워커_스포츠] 브라질전 참패의 이유가 몸값 차이? 홍명보호, 파라과이보다 1.87배, 예상 스코어는?
- [뉴스워커_스포츠] 김판곤, 신태용, 동남아에 두 번 당한 울산 축구... 역대 최초 외국인 감독 가능성은 몇 프로?
- [뉴스워커_스포츠] 한화냐 삼성이냐, 승자에 따라 달라질 한국시리즈 기록들, ‘최초’의 영광은 누구 품에?
- [뉴스워커_스포츠] 울산 HD 이청용 골프 세레모니 논란 일파만파, 악성 댓글에 고소·고발까지 등장
- [뉴스워커_스포츠 이슈] 한국시리즈 1차전 완패당한 한화, 우승까지 7%의 확률, 2차전이 판도 가를까
- 월드시리즈 씹어먹는 오타니 쇼헤이, 日 만화 '명탐정 코난' '메이저' 작가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 [뉴스워커_스포츠] 중국의 좌절, ‘또 한국이야?’ 배드민턴 안세영이 회상시킨 ‘新 공한증’과 ‘싸가지 세대론’
- ‘롤드컵 결승은 맨날 한국 팀끼리?’ 젠슨 황의 경고, 10년 뒤에도 한국이 최강일까
- 김혜성 ‘빚투’ 논란, 7년 vs 250만 달러 그리고 2번의 고소, 당신이 ‘김선생’이라면?
- [뉴스워커_스포츠] 올해 홈경기 매진 0회... 홍명보호, 가나전 이겨도 ‘유종의 미’ 없다?
- ‘메시는 다음에...’ 손흥민 멱살 캐리도 못 살린 LAFC, 밴쿠버가 악연 끊었다